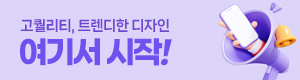![[ESG경영칼럼] '잠재적 장애' 시대, 복지 사각지대를 해체하는 신경영 전략(그림=제미니AI)](https://cdn.welfarenews.net/news/photo/202509/201308_301277_5829.png)
[ESG경영칼럼] '잠재적 장애' 시대, 복지 사각지대를 해체하는 신경영 전략
"누구나 잠재적 장애인이다."
글 ㅣ 최봉혁 칼럼니스트 ㅣ 지속가능과학회 부회장
이 명제는 단순한 휴머니즘이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냉철한 경제적 현실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합리적인 전제이다. 우리는 흔히 중도장애(中途障礙) 발생을 개인의 비극으로만 바라본다. 그러나 이는 곧바로 국가의 막대한 복지 재정 지출, 생산성 손실, 그리고 기업이 잃어버리는 숙련된 인력으로 이어진다. 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지원정책은 이러한 결과적 손해를 최소화하는 '후속 치료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예방'과 '선제적 대응'에 있다. 문제의 본질은 '이미 발생한 장애'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잠재적 장애 위험'에 놓인 모든 국민을 어떻게 사회의 주류 생산인력으로 유지하느냐에 있다. 즉,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비용 지출'에서 '인적 자본 투자'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복지 사각지대는 다름 아닌 '건강한 근로자' 내부에 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직장인, 척추와 관절에 무리가 가는 현장 노동자, 정신적 소진을 외면하는 서비스업 종사자, 디지털 피로에 지친 IT 개발자까지. 이들의 '잠재적 장애' 위험은 개인의 몫이 아니라, 그들을 고용한 기업과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이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했다.
덴마크의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 모델은 노동市場의 유연성(Flexibility)과 실업자에 대한 강력한 사회안전망(Security)을 결합했다. 기업은 경영 상황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대신, 정부는 조정된 근로자에게 즉각적인 재훈련(Re-skilling)과 새 일자리 연계라는 안전망을 제공한다. 이는 '잠재적 실업자'가 '실제 실업자'나 '잠재적 장애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선제적 투자다.
우리의 과제는 장애인고용공단의 사후 지원 노하우를, 이러한 선제적 인적 자본 관리 시스템에 접목하는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첫걸음은 '건강한 근로자'라는 편안한 인식을 깨고, 그 내부에 숨겨진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보는 데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