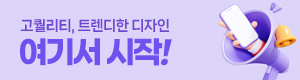[ESG경영전략] "美·日·유럽이 주목하는 '고령 장애인 고용' ESG 전략"-③
글 ㅣ 최봉혁 칼럼니스트 ㅣ 지속가능과학회 부회장
전 세계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고령 장애인 고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유엔 경제사회국(UNDESA)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50년까지 16%로 증가할 전망이며, 한국은 이미 2024년 기준 18.4%에 달해 2030년에는 2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사회공헌재단들의 현실은 여전히 단순한 홍보성 행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주요 재단들의 사업을 분석해보면, 고령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은 전체 예산의 3% 미만에 불과하다. 이는 고령 장애인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제사회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SCSEP 프로그램은 55세 이상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며, 2022년 기준 약 7만 명이 참여했다. 일본의 실버 인재 센터는 60세 이상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연계하고 있다. 유엔 경제사회국(UNDESA)의 2023년 세계 인구 고령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3년 기준 10%에서 2050년에는 16%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은 2024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8.4%에 달하며, 2030년에는 25%를 넘어선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글로벌 고령화 추세는 고령 장애인 고용 정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의 고령 장애인 고용 정책 및 사례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23.1%이며, 장애인 고용률은 21.8%로 나타났다. 미국은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ADA)」를 기반으로 고령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SCSEP)」은 55세 이상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과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2년 기준 약 70,000명이 참여했다.
AARP(미국 은퇴자 협회)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고령 장애인 고용을 통해 미국 경제는 약 1,200억 달러의 추가 생산성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BM, Microsoft, Google 등은 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원격 근무와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고용률을 높이고 있다.
유엔의 장애인 고용 권고 및 국제 동향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제27조에서 장애인의 노동 권리와 고용 기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 경제사회국(UNDESA)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장애인 고용률은 비장애인 대비 약 30% 낮은 수준이며, 고령 장애인의 경우 이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유엔 개발계획(UNDP)은 「Disability-Inclusive Business」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고령 장애인의 경우 디지털 기술 교육과 접근성 보장이 중요하며, 2022년 기준 약 50개국이 유엔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국가 정책을 수립했다.
일본의 고령 장애인 고용 시스템
일본 후생노동성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25.1%이며, 장애인 고용률은 2.3%로 나타났다. 일본은 「초고령사회 대책 기본법」을 통해 고령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버 인재 센터」를 통해 60세 이상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연계하고 있다.
도요타는 2022년 「시니어 어드바이저 제도」를 도입해 은퇴 기술자들을 계약직 전문가로 재고용했으며, 생산성 향상과 기술 전수에 성공했다. 파나소닉은 「Age-Free Workplace」 정책을 통해 고령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2023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을 2.8%까지 높였다.
유럽의 고령 장애인 고용 정책
유럽연합(EU)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EU 회원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평균 15.3%이며, 장애인 고용률은 18.7%로 나타났다. EU는 「European Disability Strategy 2021-2030」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고령 장애인의 경우 디지털 기술 교육과 접근성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은 「Teilhabe am Arbeitsleben(노동 시장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 장애인에게 직업 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며, 2022년 기준 약 30,000명이 참여했다. 지멘스는 「Experience Matters」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은퇴 기술자들의 컨설팅과 기술 지도를 연결했으며, 프로젝트 효율성이 25%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프랑스는 「Loi pour la Liberté de Choisir son Avenir Professionnel(직업적 미래 선택 자유 법)」을 통해 고령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며,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22년 기준 고령 장애인 고용률은 5.2%로 EU 평균을 상회했다.
사회공헌재단은 이제 다음과 같은 정책 전환을 통해 고령 장애인 포용에 앞장서야 한다.
첫째, 역량 기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고령 장애인의 경력과 기술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해 AI 기반 매칭 시스템으로 중소기업의 수요와 연결하는 것이다.
둘째, 세제 지원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 고령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고, 사회공헌재단의 투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맞춤형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연령 친화적 작업장 설계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유연근무제와 원격 자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대기업 사회공헌재단은 자회사를 통해 고령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단순한 자선 활동을 넘어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다.
고령 장애인의 지식과 경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값진 자산이다. 사회공헌재단이 단순한 기부처에서 '가치의 중개자'로 역할을 전환할 때, 진정한 의미의 포용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행동할 때다.
[자료출처]
유엔 경제사회국(2023), 미국 노동통계국(2023), 일본 후생노동성(2023), 유럽연합 통계청(2023)]